
기다리고 기다렸던 온더비트 자첫!
윤나무 배우의 살수선을 인상깊게 보기도 했고 드럼치는 공연이라고 해서 신선해서 너무 궁금했다. 미국 다녀옴+코로나 걸림으로 거의 4주만의 관극이 있는 주말이었다. 이 주말동안 밀린숙제 해치우듯 미수, 웨사스, 온더비트를 관극했다.
요새 연말이다보니 머릿속으로 나만의 2022 연말 결산을 하고 있다. 올해 뮤지컬은 참 많이 봤지만 재밌게 본건 대부분 연극이다. 회전극은 내가 좋아하는 배우를 보기위해 관극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거의 뮤지컬) 연극은 시놉시스를 보고 골라서 봤던 것 같다. 그래서인지 극이 맘에 드는건 연극이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여러번 보기 보다는 한두번씩 보았는데 그 때문인지 처음 봤을때의 인상, 충격등이 오래가는 것 같다. 최근 후기를 남기지 않았지만 온더비트는 자둘 전 후기를 꼭 정리하고 싶었다. 이날의 인상이 너무 강렬하고 충격이고 좋았고, 또 잊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이미 두번째 관극을 해버렸다. 당장 내일이 세번째라.. 쫒기는 심정으로 티스토리을 켰다.
오늘은 꼭 후기를 쓰고 자야지.




온더비트 왜 좋았을까.. 사실 스토리는 결말을 제외하면 거창한건 없었는데 그게 좋았다. 1인극이다 보니 1인칭 소설처럼 주인공의 생각이 많이 나오고, 장면장면이 자세했다. 누군가의 일기를 보듯 일상적 소재들이지만 (학교 생활이라던지..) 그렇기 때문에 공감이가고 특별한 일상은 사진찍은 것 처럼 기억이 됐다.
최근에 1시간짜리 뮤지컬을 보았는데 한시간안에 한명의 일생을 담아두느라 그 인물 일생의 큼직한 사건만 나열하는 식이었는데 극 전개는 나랑 참 안맞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린이를 위한 위인전 같은 느낌.. 연극이나 뮤지컬도 하나의 이야기기에 책이라면 어떤 종류의 책일지 분류해보곤 하는데 내 취향은 1인칭 소설인걸로 결론지었다. 기억나는 장면을 적기전에 이날 관극한 자리의 특성(?)에 대해 얘기를 조금 남겨놔야 할 것 같다. 자리는 D구역(오블) 1열. 드럼이 왼쪽~중앙에 위치한다고 해서 오른쪽 블럭이라 좀 아쉬웠는데 아드리앙이 얘기하는 의자가 무대 오른쪽에 있고 드럼 악보도 오른쪽이라 배우가 오블을 보고 연기하는 장면이 많았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중블 앞열을 못간다면(대부분의 경우다..) 중블 뒤 보다는 사이드 블럭 앞열을 선호한다. 좋아하는 배우의 경우 가까이서 보면 좋기 때문에.. 하지만 그 외 이유도 있는데 사이드 블럭에 앉으면 공연이 영화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 각도에서만 느낄수 있는 조명이라던지, 반대쪽에서는 볼수 없는 표정 등등..
이날 잊을수 없는 장면은 청소차 아저씨 장면이다. 청소차 어저씨가 완전 무대 정면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몸을 90도 돌리고 연기하고 있는데, 티오엠 2관은 원형극장이라 오블에서는 거의 정면으로 보인다. 그래서 청소부 아저씨를 정면에서 볼 수 있었는데 연기톤도, 표정도 너무 웃겨서 계속 생각난다. “비-켜. 안비-켜?”
그리고 무대를 엄청 넓게 쓰는데 가까울땐 엄청 가깝고 멀때는 엄청 멀게 느껴져서 더 극적이었다.
조명은 음악에 맞춰서 빠르게 전환되는 연출이 많았는데 그 순간순간이 스탑모션처럼 느껴졌다. 이 사진처럼 느껴지는 장면들을 잊고 싶지 않았는데, 벌써 기억에서 흐려지고 두번째 관극에서 보았던 이미지들과 겹쳐 버렸다. 이래서 후기는 미리미리..
약간 발레처럼 춤출때, 신나서 뛰어다닐때, 눈물이 눈가에 번진 얼굴, 투명한 눈빛(?) 등이 생각난다.
공연을 보고 나서 친구한테 너무너무 좋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어느점이 좋았냐고 질문을 받았다.
곰곰히 생각해보니 분위기. 극에 나온것 처럼 분위기는 잊혀지지 않는 것 같다. 말로 설명 할 순 없지만 그 순간을 함께 공유 한 사람들만 알수 있는 분위기. 최근에는 정말 관성적으로 공연을 보러 다녔는데 이날 공연은 정말 순간의 예술이라고 느꼈다. 아무리 자세히 적는다 해도 그날의 분위기는 적을수가 없다. 하지만 느낄수도 없냐고 묻는다면 그건 아니다. 기억을 떠올려보면 그 분위기가 느껴지니까.. 분위기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적으니 이 단어가 참 낯설게 느껴진다. 그리고 극에서 설명하는 드럼비트를 들었을때 낯설지가 않았다. 아드리앙이 설명해주는 서커스, 군악대, 아프리카 리듬등을 들었을때 실제 내가 그 리듬을 들었던 과거의 순간들이 생각이 났다. 드럼 비트만으로도 나를 과거로 보내주고 그날의 분위기도 떠오르게 해주는게 너무 신기했다. 아드리앙의 생각이 남의 생각이 아니라 나에게도 적용되는 말이어서 아드리앙에게 친밀감을 느끼게 됐다. 아드리앙의 문장에는 아드리앙만의 생각이 있다. 정적이라던지 음표, 고스트 노트라던지.. 어디선가 들어봤던 상투적인 표현이 아니라 누군가의 시각이 온전히 담긴 텍스트를 오랜만에 봐서 신선하고 와닿았고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다. 음을 빛나게 해주는 정적. 살면서 한번쯤은, 아니 수없이 많은 침체기를 만난다. 그 순간들이 침체기가 아니라 아름다운 음을 위한 정적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삶이 조금은 위로가 될 것 같다. 그리고 아드리앙이 공연중에 한번, 커튼콜에 한번 노래가 나올때 오른쪽에서 왼쪽을 지나며 객석들을 콕콕 찝어주는데 여러분들 모두가 음표라고해주는 것 같다. (아마 그렇게 의도 된 연출이겠지만) 객석의자가 오선지고 앉아있는 관객은 음표고, 이 음악이 아름다울수 있게 연주해주는 아드리앙이 있다. 극중에서 결말을 보면 아드리앙의 노래는 멈춘것 같다. 정적의 시간. 공연이 끝나면 가슴한켠이 무겁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정적의 순간이었으면 한다. 결말은 참 충격이지만 그래도 순간순간 위로도 받고 속상하기도 하고 울고 웃을수 있는 아드리앙의 인생이면서 “인생” 그자체를 설명해주는 극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소소하게 기억 나는 부분들
- 드럼스틱 조각이 연주중에 살짝 날아갔었는데 태연하게 이어나가는거 보고 놀랬다. 바로 치우진 않고 좀 뒤의 장면에서 아무렇지 않게 치우심
- 드럼 연주중에 유난히 치면 가슴도 쿵쿵뛰는 애가 있었는데 아드리앙이 너도 챔피언이라고 뽀뽀해주는 애가 걔여서 뭔가 공유하는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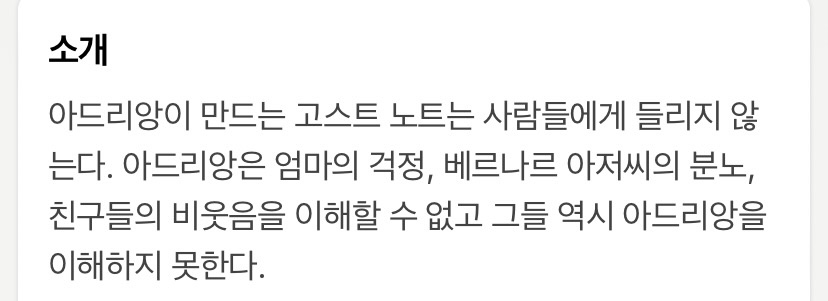
- 친동생을 공연 데려가려고 시놉시스를 찾았는데 공연 보기 전 관객은 이해 할수 없게 써진 것 같다.. 보고나서는 너무 가슴이 아프지만.. 아드리앙이 만드는 고스트 노트는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는다니... 이렇게 극악무도 할수가..
- 아드리앙이 노래에서 악기들을 분류해 낸다고도 라고 드럼칠때는 왼손 오른손 왼발 오른발 박자를 하나로 합치기도 하는데 이런과정을 나도 해보게 된다. 실험실에 있으면 온갖 팜프소리, 장비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를 분리 해보고 다시 합쳐 보면 어느새 리듬을 탈정도로 박자가 만들어져있다 ..ㅋㅋㅋㅋ
- 후기 쓰기 숙제 끝! 이제 개운한 마음으로 자셋하러 가야지 ㅎㅎ


'뮤지컬, 연극 > 연극'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21229 온더비트 (윤나무) (0) | 2023.02.05 |
|---|---|
| 221227 온더비트 (윤나무) (0) | 2022.12.29 |
| 221120 히스토리보이즈 (박은석 김현진 윤승우 김효성 구준모) (0) | 2022.12.10 |
| 221118 히스토리 보이즈 (박은석 김현진 윤승우 김효성 심수영) 럭드 (0) | 2022.12.10 |
| 221116 아트 (노주현 백일섭 이순재) (0) | 2022.12.10 |